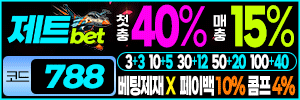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영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예고 없이 외로움이 엄습하는 밤이면 흔히들 옛사랑을 추억하며 씁쓸한 미소를 짓는다지만, 나는 보통 ‘멍청하게 흘려보낸 섹스 타이밍'을 떠올린다. 그리고는 미색 노트패드 위에 ‘주인공인 내가 흑석동에 건물을 하나 사서 거기다 하렘을 구축한다'는 둥의 야설이나 끄적인다.
뭐라 표현하면 좋을지 몰라서 흘려보낸 섹스 타이밍이라 했는데, 풀어쓰자면 '섹스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흘려보낸 기회'를 의미한다. 줘도 못 먹은 한심한 역사랄까.
옛사랑의 추억은 가슴을 아리게 한다지만, 허허히 흘려보낸 섹스 불발의 추억은 가슴 한쪽은 물론이요, 아랫도리까지 아리게 한다.
아, 나 걔랑 할뻔했는데. 씨.
기억 하나, 이사 다음날 짐 푸는 거 도와 달라고 걔가 날 불렀을 때(근데 어쩐 일인지 집에 걔밖에 없었을 때), 일 끝내고 밥 먹으러 가자 했더니 그냥 자기가 가락국수 끓여준다고 했을 때, 가락국수 먹고 입가심으로 키스했을 때.
근데도 난 그날 못했다. 한참 패팅 중에 걔가 "울 엄마 언제 올 지 모르는데..."라고 해서. 아, 그럼 다음에, 라고 생각했지만 다음은 없었다. 뭣 때문에 남남이 됐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암튼 그렇게 됐다.
왜 몰랐을까. ‘엄마 언제 올지 모르는데', 라는 건 그만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엄마 오기 전에 얼른 진도 나가’라는 뜻이었다는걸. 그래, 나는 차여도 할 말 없는 새끼였다.
기억 둘, 선후배 모여서 바다로 놀러 갔을 때, 늦은 밤 술자리에서 선배 누나가 내 말에만 유난히 박장대소 웃었을 때, 자기 남자 친구랑 사이 안 좋다고 자꾸 어필했을 때, 귓속말로 담배 한 대 태우러 같이 베란다에 나가자고 했을 때, 담배 태우면서 내 연애 스타일이 어떤지(천천히 시간을 두는 타입인지, 훅 달아오르는 스타일인지) 물어봤을 때, 자기는 교회 다니지만 성적으로 개방적이라는 얘기를 밑도 끝도 없이 꺼냈을 때, 베란다 넓은데 자꾸 팔이 닿았을 때, 결정적으로- 펜션에 방이 많아 누나 혼자 방을 썼고 다른 사람들은 건넌방에서 다들 곯아떨어졌을 때.
그때도 난 못 했다. 누나가 ‘잘 자'라고 해서. 누나 편하게 주무시라고 그냥 방에서 나왔다. ㅆㅂ.
왜 몰랐을까. 순진한 동생을 꼬시는 누나들은 담배를 겁나 맛있게 태우면서 교회 얘기를 한다는 것을(성스러운 퇴폐미랄까). 내 아랫도리는 먼저 눈치 까고 불끈거렸는데, 애석하게도 내 머리는 미처 몰랐다(이 몹쓸 것을 그만 ‘대가리'라 부르고 싶다).
그게 뭐 그렇게나 아깝다고 지질하게 넋두리나 늘어놓고 있느냐 하면, 만날 이런다는 건 아니다. 외로운 밤이면, 그렇다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섹스 타이밍을 놓친 추억은 모두 지금보다 한참 어렸던 시절의 일들뿐이다. 사회라 불리는 시궁창을 몇 년간 구르다 보니 나의 대가리한테도 소위 눈치라는 게 생겨서, 예전에 몰랐던 그 무수한 ‘신호'들이 이제 와서 별안간 해독이 되는 것이다. 차라리 영영 모르면 좋았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근래 와서는 후회할 일을 안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다만 양상이 달라졌달까. 요컨대 풋내기 시절에는 ‘줘도 못 먹어' 후회할 일이 많았다면, 요즘 와서는 ‘먹으면 안 되는데 무턱대고 집어삼켜서' 후회하는 일이 종종 있다(주의! 함부로 먹지 마시오). 그리고 그 여파는 한밤에 곱씹으며 외로움을 달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흉행(?)’으로 닥치기도 한다.
어쩌면 오늘도 풋내기 시절이 돼버릴 먼 훗날에는(사십이면 불혹ㅡ혹하지 않는다ㅡ이라니까 아마 그 즈음?), 지금처럼 달밤에 과거의 후회거리들을 곱씹으며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러고 궁상떨고 있지 않으려나.
아니면 그때도 ‘아, 나 걔랑 할뻔했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고.
사실 그랬으면 좋겠다. 사십이 아니라 오십, 육십이 되어서도 ‘못한 섹스에 아쉬워하는', 지금 상(변)태 그대로였으면.
끝.